[AI 요약] 넷플릭스가 최근 가격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문제는 가격 인상 시기가 묘하다는 점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ISP(인터넷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지불을 두고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최근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역시 CDN 업체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마 국내 ISP에게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망 이용료’ 논쟁과 한국 창작자들에 대한 글로벌 흥행 성과 보상 미흡 등으로 코너에 몰린 넷플릭스가 향후 추가적인 비용 확보를 위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넷플릭스가 최근 가격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가장 낮은 베이직 요금제는 유지한 채 스탠다드 요금제는 1500원을 올린 1만 3500원으로 12.5%, 프리미엄은 2500원을 올린 1만 7000원으로 17.2%가 인상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5년 만에 처음 발표된 가격 인상이다.
문제는 가격 인상 시기가 묘하다는 점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ISP(인터넷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지불을 두고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글로벌 1위로 사상 최대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 게임’을 통해 K-드라마의 세계화에 자사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는 점, 국내 창작자들, 제작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사상 최대 흥행에도 불구, 관련된 제작사나 배우들이 흥행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진출 이후 최초로 단행한 가격 인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 순위를 매긴 ‘클로벌 톱10’ 방식을 적용하며 화제가 됐다. 매주 화요일마다 주간 순위 및 시청자 수를 공개하는 방식인데, 이는 넷플릭스가 이전에는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첫 ‘글로벌 톱10’ 1위는 단연 ‘오징어 게임’이었다. 놀라운 것은 공개 첫 4주인 28일 간 세계 각국의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16억 5045만 시간 동안 봤다는 사실이다. ‘년’ 단위로 따지면 무려 18만 8407년이다.
비영어권 드라마라는 점, 그리고 기존 흥행 드라마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제작비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이는 넷플릭스 스스로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전 다른 흥행작들의 시청 시간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징어 게임’ 등장 이전 영어권 드라마 1위였던 2020년 작 ‘브리저튼:시즌1(6억 2549만 시간), 비영어권 드라마 2위 2020년 작 '종이의 집:파트4(6억 1901만 시간)’와 비교해 12억 시간을 앞선 기록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도 “예상을 뛰어 넘는 기록”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오징어 게임의 시청 시간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공개된 세계 주간 시청 시간 ‘톱10’에 드는 한국 드라마가 비단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달 8일~14일 사이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한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것은 2위 KBS 드라마 ‘연모’ 3위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였다. 5위에 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네임’까지 포함하면 10위 안에 총 4편의 작품이 포함된 것이다.
더구나 넷플릭스를 통해 최대 기대작인 ‘지옥’은 물론 최초 시도되는 시뮬레이션 예능 ‘신세게로부터’ 가수 비와 노홍철을 내세운 여행 콘셉트의 예능 ‘먹보와 털보’ 등 다양한 작품들이 줄줄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트래픽 증가와 그에 따른 ‘망 이용료’ 논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렇듯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며 국내외 OTT 플랫폼이 앞다퉈 새로운 작품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갈등은 이제 두 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닌 상황이 됐다. 연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 그리고 국내 OT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통신 3사 간에 어떤 식으로 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쟁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자체 구축한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통해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트래픽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CA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의 일종으로 스트리밍 방식의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던 넷플릭스가 2011년 내 놓은 해결책이다.
OCA의 기능을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콘텐츠 집적소라 할 수 있다. 이용율이 높은 콘텐츠가 글로벌 망을 통해 전송될 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각 지역에 OCA를 두어 이용률이 높은 콘텐츠를 미리 OCA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트래픽 부담을 줄이며 제공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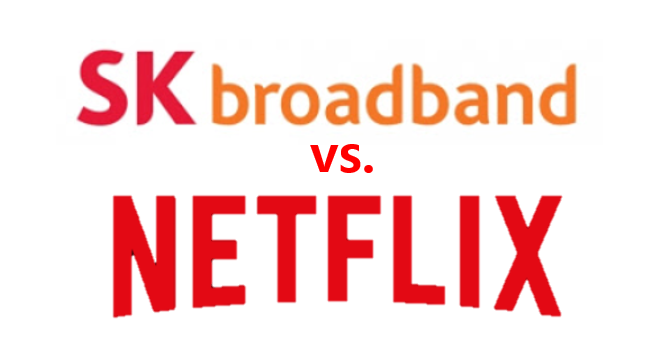
넷플릭스는 이러한 OCA를 지금까지 142개국에 1만 4000개 이상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10억 달러(1조 1825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도 “OCA를 통하면 과도한 트래픽을 해결할 수 있다”며 망 이용료 납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업계는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해도 국내 ISP의 망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넷플릭스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인 즉 넷플릭스가 이야기하는 OCA는 현재 일본과 홍콩에 설치돼 있다. 일본과 홍콩으로 들어오는 국제구간에서는 트래픽 감소 효과가 있지만, 일본과 홍콩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구간은 여전히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OCA를 국내에 설치한다면 어떨까? ISP측은 이 역시도 ‘큰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OCA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구간의 트래픽 감소 효과를 줄 뿐, 개별 국내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인터넷 망의 트래픽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ISP측의 입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넷플릭스 조차도 국내 캐시서버에서 개별 이용자에게 이르는 전송구간에 대한 책임까지 CP가 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ISP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논리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넷플릭스와 구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외 CP들은 ISP가 요구하는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망 이용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최근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역시 CDN 업체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마 국내 ISP에게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이후 첫 가격 인상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넷플릭스에 이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플러스는 엄청난 콘텐츠 파워를 내세우며 빠르게 한국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월 이용료는 9900원에 불과하다. 넷플릭스 기본 요금인 9500원에 비해 약간 높지만 연간 비용을 9만 9000원으로 책정해 연간 멤버십 결제 시 한 달 비용은 8250원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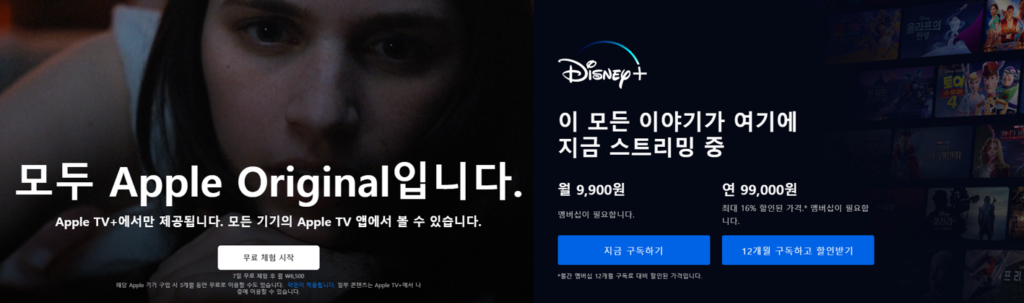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 1만 3500원, 프리미엄 요금제 1만 7000원과 비교하면 최대 2배가 량차이가 난다. 더구나 동시접속 4개, 최대 7개의 계정으로 공유할 수 있다.
막 한국에 진출한 애플TV플러스의 OTT 가입자는 월 6500원만 내면 된다. 최대 6개의 계정으로 공유할 수 있고, 애플이 판매하는 모든 iOS 기반 디바이스로 시청이 가능하다.
글로벌 OTT 경쟁사들만 놓고 봤을 때도 넷플릭스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행하는 가격인상인 셈이다.
넷플릭스는 5년 간 가격 인상이 없었다는 점,콘텐츠 투자를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를 가격 인상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망 이용료’ 논쟁과 한국 창작자들에 대한 글로벌 흥행 성과 보상 미흡 등으로 코너에 몰린 넷플릭스가 향후 추가적인 비용 확보를 위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논쟁 속에 국내 OTT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