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추상화를 그리거나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기도 한다. 인간과 협업해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할까? 나아가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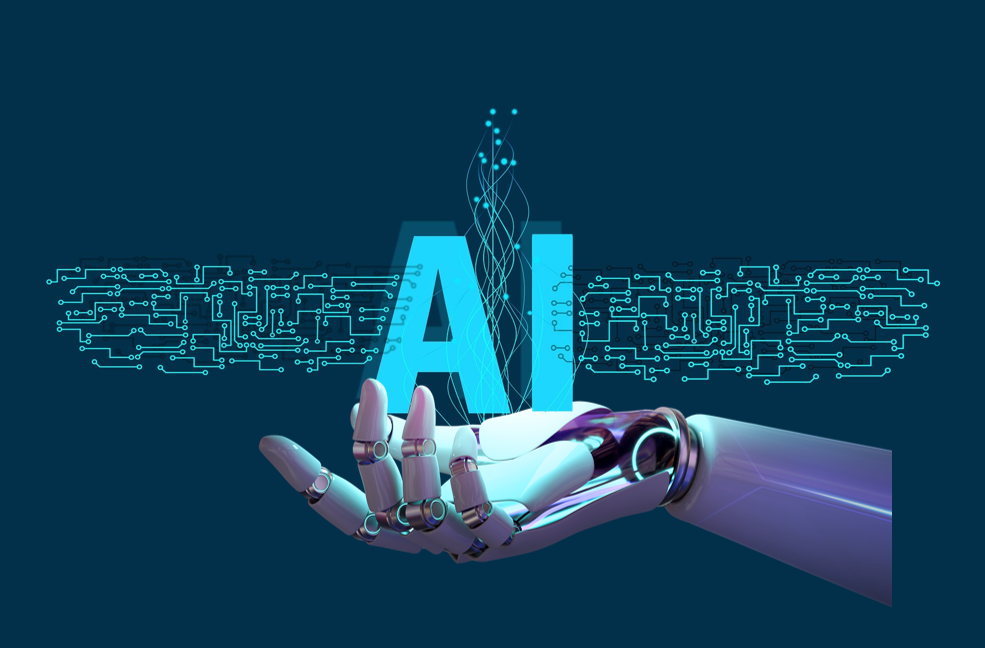
최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 분야에서도 기계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예술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고흐나 렘브란트의 화풍을 따라 하거나 비틀스 스타일의 음악을 작곡한다. 이들은 고전 미술의 화풍과 질감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도 한다. 모방과 창조가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이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 논의도 뜨겁다.
지난 2월, LG AI연구원의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이 만든 아티스트 틸다가 뉴욕 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로 데뷔했다. 첫 AI 휴먼인 틸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거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말뭉치 6000억 개, 텍스트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2억 5억만 장 이상을 학습한 AI 엑사원이 바로 틸다의 두뇌라 할 수 있다.

틸다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리디어스 대표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했다. 박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요청하면 틸다의 두뇌(EXAONE)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박 디자이너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얻어 패턴을 만들고 실제 의상을 디자인한 것이다.
틸다 뿐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은 인간 고유 영역인 창작을 다양한 영역에서 펼치고 있다.
완벽한 모방에서 몽환적인 추상화까지, AI 예술가

문화예술 분야의 인공지능(AI)에는 구글의 ‘딥드림(Deep Dream)’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딥드림(Deep Dream)’은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통해 수많은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해 시각화한다. 이미지 속 요소들을 세분화해 패턴을 적용하고 이미지를 변경한다. 그 결과물이 마치 꿈을 꾸는 듯 추상적이라고 해서 ‘딥드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트위터의 ‘딥포저(Deep Forger)’는 기존 이미지의 질감만 변형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누구든지 트위터에서 사진을 딥포저 계정에 보내면 인공지능(AI)이 만든 자화상이나 풍경화를 받아볼 수 있다. ‘Picasso(피카소풍으로)’, ‘Gogh(고흐풍으로)’ 같은 특별한 키워드를 사용하면 새로운 추상화를 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공지능(AI)은 고전 작품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한다.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라는 인공지능(AI)은 네덜란드의 광고 회사와 ING,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으로 협업한 프로젝트다. 연구진은 딥러닝 기법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Van Rijn)의 작품 346점의 데이터로 학습시켰다. 그 결과 렘브란트의 화풍을 닮은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한편 인공지능(AI) 예술가가 만든 작품들은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다. 딥드림이 그린 작품 29점은 2016년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에서 총 9만7000달러(약 1억1000만 원)에 판매됐다.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프랑스 인공지능(AI) 화가 ‘오비어스(Obvious)’가 그린 ‘에드몽 드 벨라미’란 제목의 초상화가 43만2500달러(약 5억 원)에 낙찰됐다.
음악과 시, 시나리오까지 창작 영역을 넓히는 AI
인공지능(AI)은 그림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6년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이 주최하는 공상과학 문학 공모전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예심을 통과하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AI) ‘샤오이스(小氷)’가 시집을 내기도 했다.
2016년 ‘사이파이 런던 영화 페스티벌(Sci-Fi London film festival)’에서는 인공지능(AI)이 시나리오를 쓴 <선스프링(Sunspring)>이라는 단편 영화가 주목을 받았다.
<프랑켄슈타인> 작가 메리 셸리의 이름을 딴 MIT의 인공지능(AI) ‘셸리’는 트위터를 통해 괴담을 써 내려갔다. 다른 점은 트위터 유저들과 상호작용하며 공동 창작을 했다는 점이다.
음악에서는 예전부터 인공지능(AI)의 가능성이 주목받아 왔다. 이미 195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일리악(iliac)이 16세기의 곡들을 분석해 ‘현악 4중주를 위한 일리악 조곡(The Illiac Suite for the String Quartet)’을 만들었다.
2012년 런던 교향악단(London SymphonyOrchestra)이 인공지능(AI) 이아모스(Iamos)가 작곡한 ‘심연 속으로(Transits-Intoan Abyss)’란 곡을 연주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후 딥러닝으로 작곡하는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AI) 에이바(Aiva)는 3만 개가 넘는 기존 곡들을 학습해 영화 OST를 작곡했고,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음악저작권협회(SACEM)에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은 최초의 인공지능(AI) 작곡가기도 하다.
현재는 틱톡에 인수된 ‘주크덱’에서는 인공지능(AI)이 영상에 맞는 곡을 작곡해 무료 음원을 만들어준다. 주크덱 외에도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영상 배경음악을 만드는 사이트들이 많아졌다. 루크 스캇 감독의 영화 ‘모건(2016년)’ 예고편은 IBM의 인공지능(AI) ‘왓슨’이 만들어 주목을 끌었다.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인공지능(AI)의 창작 활동과 함께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작물의 저작권이다.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음악이 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의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 박사는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AI) 다부스(DABUS)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2016년부터 요청해 왔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사람의 의도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창작물 주체는 ‘인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국외 지식 재산법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창작 활동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권리나 책임을 질 주체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업계에선 인공지능(AI)이 생산한 창작물의 소유와 권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이득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 셈이다.
인공지능(AI)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뛰어난 사고를 하고 인간이 만들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작품을 만드는 수준에 와 있다. 언젠가 인간은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야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할 것인지, 인간의 예술작품과 동등하게 평가해야 해야 하는지,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소유와 권리는 누구의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