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전면적으로 리유저블 컵(reusable, 재사용이 가능한 컵) 정책을 시행한 어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다. 단계적으로 리유저블 컵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일회용 컵이 제공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내고 리유저블 컵에 커피를 담아 가져가야 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보증금도 받고 컵도 반환하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서울로 가져왔더랬다. 과연 이러한 리유저블 컵을 얼마나 사용하게 될까?
리유저블 즉 재활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또 어떠할까? 1천 원 보증금도 아깝지 않다며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던 텀블러가 보온이든 보냉이든 오랜 시간 유지해주는 것이 있어 자주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친환경에 대한 인식보다 음료 자체를 처음 나왔을 때처럼 유지해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의였지만 어쩌다 보니 환경보호에 일조한 경우라고 해야 할까.

일주일에 딱 하루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다. 분명히 지난주 집에 모아둔 것들을 내다 버린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양손이 무거워졌다. 그렇게 플라스틱부터 빈병이나 캔, 폐지까지 잘 구분해서 버리고 나면 속이 다 개운해진다. 그런 와중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여보자는 생각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고 설거지할 때 쓰던 플라스틱 용기 세제도 비누로 바꿨다. 거품이 잘 나지 않아 제대로 닦이는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비누야 녹으면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사라져 버리지만 플라스틱 세제는 용기라는 존재를 남긴다. 이렇게 다 써버린 플라스틱을 아무렇지 않게 바다나 강에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부유물로 떠다니는 흔적들을 아주 쉽게 마주하기도 한다. 심지어 종류도 꽤 다양하다. 어느 커피 프랜차이즈의 로고가 명확하게 새겨진 컵도 보이고 시원한 콜라가 담겨있었을 페트병도 둥둥 떠다닌다. 먹고 버린 컵라면 용기마저도 바다 위를 표류하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보이고 산에 가서도 낙엽 사이로 은폐하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눈에 띄고 만다. 누군가가 소중하게 손에 쥐었을 그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시간이 흐르고 다 삭아버렸을 플라스틱 등의 온갖 쓰레기들은 중금속이 되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미세한 흔적들로 남아 결국 인간에게 이어지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진 쓰레기가 또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무심코 던져버린 플라스틱 하나가 수도 없이 쌓여 축적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처도 없이 떠돌아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그보다 무서운 재난 영화는 없을 것 같다.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김수암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쓰레기 투기 자체는 생물의 다양성을 낮출 뿐 아니라 오염된 먹이망이 불균형을 이뤄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구가 앓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쓰레기로 인해 끙끙 앓고 있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2개나 되는 해안국에서 매년 2억 7천5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 중 적게는 480톤, 많게는 1천270만 톤의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니 아프지 않은 게 더 이상할 정도다. 그렇게 삭아버리고 분해된 플라스틱은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변모하여 결국 우리의 입으로 돌아온다. 무엇인가 맛있는 것들이 담겨있었을 수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에서 지름만 해도 고작 5밀리미터 이하 더 작은 수준으로는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적 재앙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지구의 생명체 중 그 어떠한 존재도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능력은 없다고 했다.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은 고작 수천 개가 아니라 천문학적 숫자에 가까운 수천 조개로 떨어져 나와 전 세계 해양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 중 일부는 물고기나 바다거북, 고래 등 해양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먹고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에 화상회의, 원격수업 등이 이뤄진 바 있다. 그나마 나아졌다고 생각한 코로나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재택근무 중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무렵 운동 삼아 동네 주변을 힘차게 뛰어다녔다.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간혹 보이던 쓰레기들이 바람에 나뒹군다. 비닐을 가져와 이를 주워 담았던 적이 있다. 얼음이 가득 채워졌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흔적은 이제 다 녹아버려 미지근해졌고 그렇게 쓰레기로 남았다. 주변 곳곳에 마스크의 흔적들도 보인다. 땀에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그냥 낙엽들 위로 벗어던진 듯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때 마스크 대란이 있기도 했다. 일단 쓰레기가 되든, 친환경이 무엇이든 입과 코를 가리기 위한 방어막이 시급하다며 대량으로 생산했다. 잘 챙겨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볍고 간편한 것임에도 길거리에 나뒹구는 마스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인간은 마스크를 쓰며 자신을 보호하지만 버려진 마스크는 그 무엇도 보호하지 못하고 지구라는 땅 위에서 위기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2007년 12월 서해안 부근에서 유조선이 좌초되어 무려 1만 2천500킬로 리터에 해당하는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부경대 김수암 교수 역시 이곳을 찾아 봉사했다고 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위기가 아니다. 점차 축적되는 쓰레기 자체가 환경 재난을 만드는 것이고 보호가 필요한 바다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도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고 분리수거는 물론 쓰레기를 알아서 챙겨갈 수 있는 국민의 인식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우주라는 공간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고 하지만 지구라는 공간은 유한한 것이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 푸르게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위로 아주 미세한 것들이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개개인의 실천이 실행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영화의 엔딩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지구의 쾌유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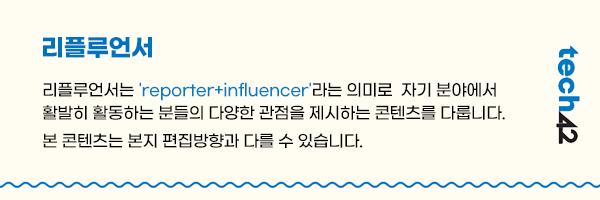

소셜댓글